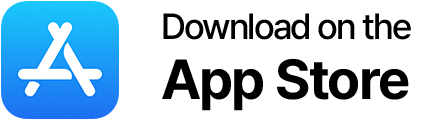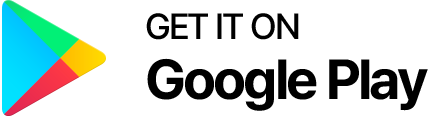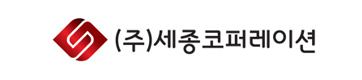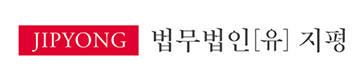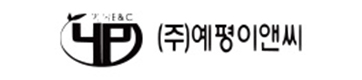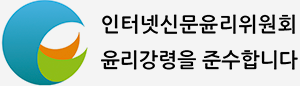서울시내 A사업장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면식 하나 없는 조합 사무실을 들어갈 때면 긴장감보단 설렘이 앞선다. 낯선 이들과 극도의 경계심을 부딪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자리 앉기 전 조합 사무실을 빠르게 스캔한다. 책상 위치로 직급을 눈대중으로 짐작해 본다. 서류 보관을 어디, 어떻게 하는지도 슬쩍 본다. 사무실은 그 조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 단서다.
A사업장에서 흥미롭게 느낀 건 달력과 각티슈였다. 보통 1개 정도 있을 법한 달력이 벽에 4개나 걸려 있었다. 회의용 탁자에는 무려 각티슈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 건설사에서 보내온 물품들을 차별 없이 배치한 건, 사소한 오해의 눈길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합장 의지에서 비롯됐다. 동시에 여러 건설사가 우리 사업장에 관심을 타진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안내 목적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앞선 사례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시공사 선정' 관련 담론을 꺼내고 싶어서다.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합친 단어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최적점을 찾아가는 긴 항해가 바로 정비사업인 셈이다. 시공사는 항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다. 건축비용은 물론, 분양 상품성, 더 나아가 향후 아파트 미래가치를 결정짓는 존재감과 힘을 갖고 있어서다.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던 조합도 바람 잘 날 없게 되는 시기가 있다. 한남4구역이 지금 그렇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모두 이탈하지 않고 활동 중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부담이 커지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무슨 사고라도 하나 터지면, 없던 규정이 생겨나고, 그 규정은 오롯이 비용상승으로 직결된다. 이 말은 즉슨, 하방안정성을 갖춘 사업장 아니면 시공사들은 결코 경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니면 특정 시공사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사전 교감을 마친 사업장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한남4구역을 두고 건설사 간 고도의 물밑 경쟁이 여전하다. 이는 조합 집행부가 똘똘 뭉쳐 어느 한 시공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조합장과 이사(상근·비상근), 대의원 모두 각자 선호하는 건설사가 있다는 의미다. 사람이기에 개인 선호도의 존재와 그 차이는 당연한 일이다. 입찰지침서를 두고 계속된 잡음이 발생한 것도 여러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입찰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한남4구역은 입찰지침서와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정작업을 마쳤고, 용산구청에 넘긴 상황이다. 모든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조합원이 크게 우려하는 건 집행부 갈등이다. 한남4구역이 입찰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비롯된 내분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해야 할 이유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의 입찰제안서를 받아서, 비교한 뒤, 투표하면 된다.
조합원들은 입찰지침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던 근래의 '시끌벅적함'을 오히려 반겼을 거 같다. 입찰공고를 앞둔 시점,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게 조합원들에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이 더 이상 흔들리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 잠깐의 흔들림은 조합원의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계속 흔들리는 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