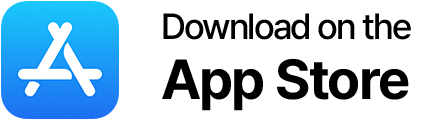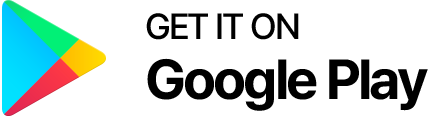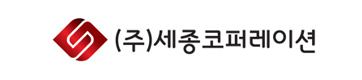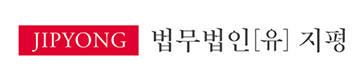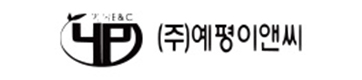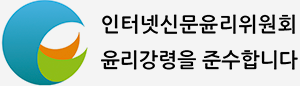흔히 정비사업의 꽃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 아닐까 싶다. 개별 조합원마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터라, 조합 입장에서도 아주 예민한 단계가 아닐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은 1세대 또는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넓은 대지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은 소위 '1+1'이라고 불리우는 다주택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1+1'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1주택(+1)의 경우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다. 또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보유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추가 1주택(+1)의 분양가격이다. 조합원 분양가로 할 것인지, 일반분양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다 보니 첨예한 갈등 양상이 빚어진다. 여러 이견(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조합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분양가의 10~20% 수준을 안전 마진이라 보는 이유다. 다만,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셈법으로 갈등이 빚어진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2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보다,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1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돼 있다. 조합의 분양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전체 조합원들의 분담금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주택만 분양받는 다수의 조합원과 2주택을 가져가는 비교적 소수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은 명료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 초창기부터 정관에 이를 규정해 놓는 방법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비사업에서 모든 조합원을 웃음짓게 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사업 초기엔 추가 1주택 분양가격 결정 과정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붙는 프리미엄(P)도 없는 단계이기에, 원주민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다만, 정관에 미리 못박아 놓지 못한 상황일 경우엔 조합이 처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살펴가며 솔루션을 찾아나가야 한다. 추가 1주택을 둘러싼 공급가격 결정 방법을 두고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반대 세력이 생겨날 경우엔 결국 모든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곧 사업성과 연결되고, 사업성은 다시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내야 할 돈과 연결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